![]()
커몬 앱에 올릴 커먼 에세이를 쓰기 위해 가장 먼저 주제 또는 소재를 정해야 했다. 에세이의 목적은 자기 소개이지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만큼이나 지루하게 “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년 도에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고 무얼 잘 하고…” 이런 식의 글을 쓰면 결코 입학심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자기를 잘 소개하면서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글이어야 하므로 무엇을 소재로 삼아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세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 코난군과 마주 앉아 코난군이 어렸을 때의 몇 가지 일화를 말해주었다. 코난군도 자신이 생각해온 주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커몬 에세이는 한 편만 써서 올리면 되지만 지원할 학교에 따라 추가 에세이를 요구하기도 하니, 딱 한 가지 주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후보로 정했다. 그 중에 커몬 에세이 주제로 최종 선택한 것은 코난군이 킨더가든 학년 발렌타인스 데이 무렵에 있었던 일화였다.
2014년 2월 19일에 내가 블로그에 썼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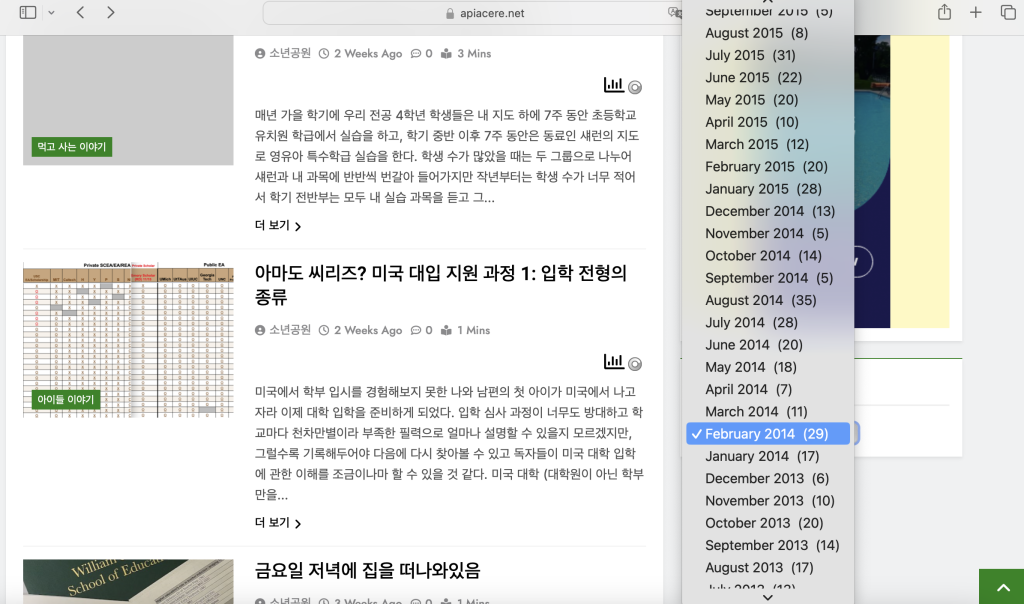
처음에는 내 글을 보여주지 않고 그 날 있었던 일과 느낌을 말해주었는데, 코난군은 어릴 때 일이어서 그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지심리학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유아기 자서전적 기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았다. 나에게는 아직도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데, 정작 당사자인 코난군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에피소드… 그래서 코난군의 초안에는 사실 관계가 흐릿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차 안이 더워서 초콜렛이 녹아내렸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발렌타인스 데이는 2월이기 때문에 주유를 하는 동안 시동을 끈 차 안이 갑자기 더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콜렛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코난군이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내 생생한 기억이 그랬고, 11년 전에 쓴 블로그를 확인해보니 그랬다. 포장지를 벗기고 손바닥에 올려 두었기 때문에 추운 2월의 날씨에도 손바닥의 온기 때문에 유난히 부드러운 리시스 캔디가 녹아내렸던 것이었다.
25년 가까이 써오고 있는 블로그 덕분에 사실에 기반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자녀의 에세이 쓰기를 잘 돕는 훌륭한 엄마가 되었다.
다음은 코난군의 에세이 원문과 챗지피티에게 시켜서 번역한 글이다.

I was six years old when I first discovered the greatest candy in the world: the Reese’s Peanut Butter Cup.
It was my kindergarten Valentine’s Day, my first experience exchanging candies with little cards taped to them. I still remember the crinkly red paper bag sitting on my desk, full of kind messages and sweets. As I peered into the bag, one orange wrapper caught my eye. The bold, brown and yellow lettering seemed to call to me.
When I took my first bite, it felt otherworldly. The salty peanut butter mashed with the creamy sweet chocolate like something too good to exist. But after devouring the first piece, I had an epiphany. My first thought wasn’t how much I wanted to eat more; it was how badly I wanted to share them. So I decided to save the remaining pieces for my family after school.
On the drive home, I shared my groundbreaking discovery with my mom and little sister, handing them each their own peanut butter cup. Now, only one piece remained. As my mom stopped to fill up the gas tank, I opened the final cup, ready to enjoy it myself. That’s when I realized I wanted to save it for my dad, who was waiting at home. But it was too late; the chocolate sat in my hand for too long, already softening and beginning to melt. By the time my mom got back into the car, the once smooth circle had collapsed into my palm, now sticky and deformed. Between my sobs, I cried that my surprise for Dad was ruined.
Without hesitation, my mom grabbed napkins from the glove compartment and gently wrapped the melted candy like it was something precious. “It’s okay,” she consoled me. “We’ll save it anyway.”
When we got home, my mom presented the gooey mess to my dad in total seriousness. “You must try this chocolate, your son saved it all day just for you.” She explained the whole story, as I watched from behind, sniffling and devastated. My dad smiled, unfolded the sticky napkins, and enjoyed every tiny bite like it was the best thing he’d ever tasted.
That moment, as silly as it was, stuck with me ever since. Looking back, I see that same instinct everywhere in my life. When a friend is struggling, I’m the one who stays up late to listen. When someone succeeds, I celebrate like it’s my own victory. When a teammate misses their shot, I’m the first to pat them on the back. It’s not something I decide to do consciously; rather it feels natural to want to share feelings, and make someone’s day just a little bit brighter.
The melted chocolate taught me that caring for others isn’t about grand gestures; it’s about noticing the little things and treating them with care. My mom didn’t fix the candy for me; she treated my sadness as something real. My dad didn’t laugh at my tears; he accepted my gift sincerely. The tenderness I received from my parents that day permanently shaped how I respond to others now.
I’ve found that empathy isn’t always about fixing someone’s problems. It’s about quietly showing up, handling their fragile moments with care, and saying, “It’s okay, we’ll save it anyway.”
This is who I still am today: sentimental, caring, and overly thoughtful. I’m the person who keeps old birthday cards or movie ticket stubs, who revisits songs because they remind me of certain people, who holds on to small moments long after they’ve passed. Some might call my approach overly sensitive, but I see it as my greatest strength. My ability to feel deeply allows me to connect, to understand, and to make people feel seen, just like my parents did for me that day.
And yes, Reese’s are still my favorite candy.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탕을 처음 발견한 것은 여섯 살 때였습니다. 바로 리시스 피넛버터컵(Reese’s Peanut Butter Cup)이었죠.
그날은 유치원 발렌타인데이 행사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작은 카드가 붙은 사탕을 주고받는 첫 경험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바스락거리는 빨간 종이 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는 다정한 말과 달콤한 사탕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속을 들여다보다가 주황색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갈색과 노란 글씨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입을 베어문 순간,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짭짤한 땅콩버터와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이 어우러진 맛은 너무 완벽해서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조각을 다 먹고 나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더 먹고 싶다’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먹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초콜릿은 집에 가서 나누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이 놀라운 사탕을 자랑하며 하나씩 건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았지요. 엄마가 주유를 하시기 위해 차를 멈추셨을 때, 저는 마지막 초콜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먹으려다 문득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아빠 드려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 안에서 초콜릿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타셨을 때쯤, 매끈하던 초콜릿은 이미 손바닥에서 찌그러지고 끈적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 드릴 초콜릿이 망가졌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망설이지 않으시고 글러브박스에서 냅킨을 꺼내 그 녹은 초콜릿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든 해보자.”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 녹아버린 초콜릿을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께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코난이 하루 종일 아껴서 아빠 드리려고 했어요.”
엄마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주셨고, 저는 코끝이 시큰해진 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시며 냅킨을 조심스럽게 펼치더니, 그 끈적한 초콜릿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처럼 드셨습니다.
그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순간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때의 감정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성공하면 제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팀 동료가 실수하면 가장 먼저 등을 두드립니다. 이런 행동은 억지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 녹은 초콜릿은 저에게 ‘배려’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었습니다. 엄마는 초콜릿을 다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제 슬픔을 진심으로 받아주셨고, 아빠는 제 선물을 웃어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부모님께 받은 다정함이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공감이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연약한 순간을 조심스레 감싸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괜찮아, 우리 함께 어떻게든 해보자.”
이것이 지금의 저입니다. 감성적이고, 다정하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 저는 오래된 생일카드나 영화 티켓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사람을 떠올리며 다시 듣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때로는 예민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깊이 느끼는 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탕은 리시스 피넛버터컵입니다.
====================================
챗지피티가 제법 번역을 잘 하긴 했지만, 영어로 쓴 원문을 읽어보면 이 글의 진가가 더 크게 느껴진다. 사용한 어휘가 수준이 높으면서도 글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잘 해주었고, 문장도 지루한 서술형이 아니라 재미난 단편 소설을 읽듯 독자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식으로 잘 구성했다.
앞의 글에서 썼듯이, 챗지피티가 더욱 매끄럽게 다듬어주겠다고 했지만, 이 아름다운 가족사의 기록을 인공지능 따위가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11년 전에 찍어서 글과 함께 올려둔 사진 덕분에 코난군의 에세이는 글로 썼지만 눈에 장면이 보이는 듯 생생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 수 천 불 돈을 받고 대필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이 되었다.
이런 칭찬의 말을 코난군에게 해주면서, 엄마의 단 하나의 우려도 말해주었다.
엄마 눈에는 엄청나게 잘 쓴 에세이라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두팔벌려 환영하고 합격증을 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이 느낌이 단지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보드랍게 여긴다는 엄마의 편견 때문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쩌면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12월 15일이 되면 이 단 하나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거나, 현실로 닥쳐오게 되는 결판이 날 것이다.
2025년 10월 25일








